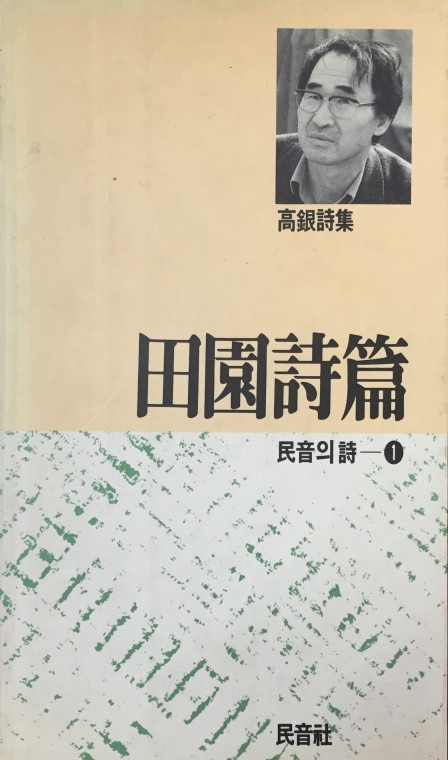머리노래
내 원시조선과 부여 이래
몇천 년 세월 살고 죽어
이 땅의 선은 오로지 농사꾼이었습니다
온갖 악 넘나들었건만
이슬 밟고
별 밟고
한 톨 쌀 내 새끼로 심어서
조상으로 거두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오 한 겨를 거짓 없음이여
몇천 년 뒤 오늘 일지라도
이 땅에서 끝까지 내 나라는 농사꾼입니다
들 가득히 가을이건대 울음이건대
저녁 논길
벌서 별 하나 떠 이 세상이 우주구나
마른 풀냄새 한 철인 마을에도
아껴 쓰는 전등불빛 여기저기 돋아난다
나는 돌아가는 저녁 논길을 외오 걸으면서
달겨드는 밤 물컷 이따금 쫓고
한편으로는 엊그제 흙에 묻힌 남동이 영감을 생각한다
죽음이 산 사람의 마음을 깊게 하는지
나도 그 영감 생시보다는 손톱만치 달라져야 겠구나
어둠에 더욱 정든 논 두루 돌아다 보아라
지난 해보다 도열병 성해서 얼마나 품도 애도 더 먹었는지
여든 여덟 번이나 손이 가는 농사가 1년 농사 아니냐
아무리 쌀 농가 헛되고 빚지는 가을이건만
가을은 가을답게 부지깽이도 덤벙대도록 바쁘다
진정코 여기서 떠날 줄 모르고 놀 줄 몰랐다
살아 보면 세월은 사람에게 큰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가장 작은 것이다
돌아가는 길 저녁 논길이 오늘따라 으리으리하게 조용하구나
자물에도 뒷장마에도 병충해에도 실컷 커서
말없이 이삭 팬 벼가 우리에게 어른이 아니고 무어냐
어서 가자 가서 매흙냄새 나는 이 몸으로
내 새끼 한 번 겨드랑이 받쳐 번쩍 어둠 속에
들어올렸다 넉넉잡고 한 나라로 내려놓자꾸나
빈 논
늦으막한 재래종 벼까지 다 베고 나니
벼 잘무리에 곰팡이 슬지 않도록
온도 습도가 사람 몇 몫을 한다
아무렴 일과 일 사이 길이 나서
어드베 훨훨 다녀올 사람이나
좀 볼 일 보고 올 사람 그 길로 나선다
한결 세상이 훤하구나 훤하구나
나야 아직 갈 데 없이 추운 들에 나가면
벌서 내 마음 배불러 한나절 밥 생각도 없다
어디에 이토촉 깊이 깊이 정든 곳 있으랴
말 없이 실컷 기쁘기도 한 날이여
여섯 달 일곱 달 내내 일한 땅이라
벼 베고 난 텅 빈 논일지라도 시장기 없는 논이구나
저 언덕 장구배미까지도 그윽하게 쉬어 보아라
사람도 수고했거니와 땅의 수고 앞서지 못한다
벼 그루터기 파란 새싹 똑똑하게 돋아나서
내년 봄 흙들이할 때까지
아니 무서리 다음 싸락눈 내릴 때까지
이 세상을 잠깐이나마 살아보아라
이제야 우리 아기 투투투 투레질해도 걱정할 것 없다
아기 입 투레질에 봄이고 여름이고
비 오지 않는 날 없지 않더냐
그 놈도 놀랍고도 잘 자라서
제 어머니 젖꼭지에만 의하지 않고
큰 양떼구름도 제법 볼 줄 알고
제가 살아갈 앞날에도 무심코 가까이 간다
보아라 어린 것만큼 생으로 원숙한 것 어디 있더냐
내 마음 넘실거리는 기쁨도 어느덧 슬픔이 되거니와
빈 논에는 어디 하나 어떤 의문 하나도 없다
이미 순한 가축인양 줄줄이 엎디어 있던
해 쪼이는 볏단도 걷어간 지 오래인지라
누구 하나 빈 논에 기웃거리지 않을 때
농사꾼은 또 농사꾼대로 한동안만이라도
숫제 깜빡하고 논을 잊어버려라
며칠 지나면 빈 논도 쉬던 땅심도
황토 객토로 부산을 떠는 하루가 다가오리라
이모작 놀리는 거개의 논은 가을갈이 또한 바쁘겠다
나는 빈 논에 있다가 돌아오며
언뜻 저녁연기 곧은 수동이 형님네 집 쪽 본다
송내 가서
여름내 우거질 대로 우거긴 풀 다 말라 버렸구나
서슬 찬 억새 댕댕이 개망초 빡주가리들도
백년을 살지 않거 단 한 철로 다하였구나
내년 여름이 확실한 바 그때 또 우거지리라
어떤 철딱서니 모르는 자 이 지존한 세상에서
내가 왕이라고 날마다 게거품 물고 뽐낼 것인가
남이나 북이나 눈꼽 하나 끼지 않은 하늘이
성거산 위에서도 쌍봉 위에서도 끝없이 뻗쳤구나
땅 위에서 스무길 현사시나무 잎새 지며
그동안 바람에 흔들리던 힘조차 버리는데
이미 겨울임에도 막무가내하고 따뜻한 오늘이여
엊그제 임술생으로 태어난 놈 울음소리 힘차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