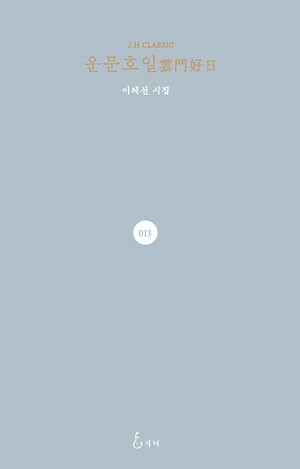
이혜선 시인의 신작시집 『운문호일(雲門好日)』이 출간되었다. 이는 불교 운문화상의 설법 가운데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조에서 차용된 제목인데, 시집의 제목이 네 글자의 사자성어라는 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풍스러우면서도 또한 삶을 단순명료하게 갈파하는 통찰 같은 것이 있다. 물론 사자성어 또는 한문어로 시집의 제목을 삼은 시집은 얼마든지 있다. 송욱의 『하여지향』이나, 김광균의 『추풍귀우』, 더욱 최근엔 이성복의 『래여애반다라』 같은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러한 한자성어만으로 이루어진 시집의 표제는 시적 산문성으로 풀어낸 제목과는 또 다른 새로운 지점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제목의 원전(原典)이랄 수 있는 운문선사의 법명 '운문'은 일차적으로 풀이해보면 구름의 문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모든 불교에서 전해지는 선문(仙問)들이 그렇듯이 이는 표면적인 의미가 결코 가닿을 수 없는 어떤 숭고한, 너머의 것을 지향하고 있을 것이다. 구름의 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단 구름에도 문이 있다는 것을 포착해낸 시인의 응시와, 지상에서 몸으로 체감되지 못하는 것들을 시적으로 조우하려고 한다는 것에 이 시집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인다. "내 마음 속에 태어나는 무수한 달"이거나 "저승길까지 밝혀주는 달", "쓸쓸한 갯벌 위로 따라오는 달"이 어릴 적 "엄마 잃은 아이"의 등을 두드려주고 있다는 시 「간월(看月)」은 공통적으로 '달'이라는 소재가 사용되지만 그러나 그 달이 계속해서 현전하도록 이끄는 것은 주체가 가야할 곳, 즉 저승길과 갯벌과 유년시절이다. 주체가 없으면 대상인 달도 존재하지 못한다.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길 바라는 것은 만인의 소망일진대, 불교는 그러한 만인의 일상이 고통으로 이루어져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 고통은 체화되는 통각이 아니고 계속해서 삶의 반복을 내면화할 수밖에 없는 피로함,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시선으로 자연을 볼 때, 유구한 대자연 역시도 일정 부분 고통과 슬픔을 지니고 있다. 새우젓을 응시하는 화자에게 "살과 뼈 다 내주고/까만 눈만 뜨고 기다리는 새우"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소금"으로 이행되고 원래의 육신은 모두 흐물흐물하게 사라져 생사의 경계마저도 망각하고 "항아리"가 된다(「새우젓사랑」). 이 항아리는 그러나 새우젓을 담은 항아리가 아니고 적멸에 든 육체를 담는 공(空)의 그릇으로 보아야 한다. 불교에서 가장 강력한 화두는 외자로 된 것들이다. 공(空), 색(色), 멸(滅), 허(虛) 등, 한자의 뜻글자만 얻어 지니거나 모든 것을 이 화두로 돌려버리는 환원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선방의 수좌들은 변화무쌍한 세상의 형상들과 대결한다. 시인이 대상과 조우하듯이 승은 상과 계속해서 정신적 육박전을 펼친다. 그리하고 나서야 호일(好日)이 있을 수 있다. 좋은 날은 얼핏 보면 사후적인 날처럼 보이지만 전(前)-언어적인 세계이고 전-의미적인 세계, 뜻과 말로써 오염되지 않은 불립문자의 세계이고 모든 사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한한 세계이며 그러나 명료한 세계이다.
석가모니는 열반의 두 종류를 설하면서, 하나는 유여(有如)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여(無如)한 것인데, 유여한 것은 일체 감정의 구속을 모두 깨치고 행복함을 취한 경지이고 무여한 것은 행복함마저 깨치고 청량감을 얻은 한 단계 위의 경지라 하였다. 열반 위에 있는 열반의 경지는 오로지 지향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확실하게 언어화되는 순간 득도는 없던 일이 된다. 이로 미루어보면 호일(好日)의 '好'는 단순히 좋기만 한 게 아니고 좋고 나쁨의 이분법을 벗어난 글자로 보아야 하리라. 시의 언어는 정해진 사물을 지시함으로써 의미를 얻어내고 그 의미의 배후를 짚어봄으로써 신화적인 언어가 된다. 호일을 담는 언어는 그렇기에 시의 형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타자와 관계함으로써, 타자를 이해하고 쓰다듬고 같이 일으켜 세움으로써 혀의 언어가 아닌 몸의 언어로 시를 보게 된다. 이 '호일'이란 과연 무엇일지를 생각하며 시를 읽는다.
김민구(서강대 국문과 박사과정)
이혜선 시집 『운문호일』은, 1135년 경에 만들어진 고전적인 선학의 문답 공안집 《벽암록(碧巖綠)》의 제6칙에서 가져온 말이다. 운문화상이 대중들에게 설법하기를 15일 이후의 일에 대해 묻고는, 스스로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이라고 말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은 이 구절을 그대로 옮겨오면 ‘운문일일호일(雲門日日好日)’이 될 것이나, 시인의 그 약어로 축약한 ‘운문호일’을 자신의 화두로 선택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삶의 가르침은 올곧은 종교가 마땅히 개진할 중생 교화의 길일진대, 시인이 이를 시의 화두로 삼는 일은 종교적 사상성과 삶의 실상을 두루 연계하여 그 깨우침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려는 의도를 포괄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Facebook Comment